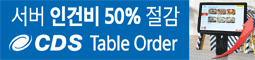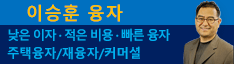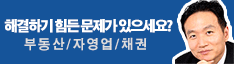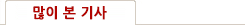무게감 있는 비로 시작한 우리에 가을은 먼산에 눈으로 겨울을 견디고 비로 다시 봄을 맞으며 여름 문턱에 다다랐다. 빗물에 녹아 내려간 기억들이 아쉬움으로 남아 되살아 온다. 아직 우리 모두 창밖으로 지나쳐 가버리는 싸한 꽃가루 재채기와 봄꽃의 향기를 거실에 앉아 기억해내고 잃어버린 문밖 출입의 자유를 그리워 하며 마지막 인내를 가다듬고 있다. 손꼽아 고대하던 주지사 양반의 반가운 뉴스가 있었다. ‘생활의 거리두기’를 실천하면 다소간의 야외활동을 허용한다는 공지였다.
주저하며 더기다릴 여유가 없다. 이렇게 갇혀 있다가는 ‘우한폐렴’에 걸려 문제가 생기는 것 보다 먼저 굶어 죽겠다는 소란도 있었다. 봄을 머금은 초목이 여름으로 달리며 잎새가 진초록으로 변하고 한해살이 야생화 작은 꽃망울들이 때를 맞아 맑은 햇살에 노랑 파랑 보라로 빛나는 키작은 초원 위로 올라가야 했다. 숨쉬는 대지 위에서 사방 팔방으로 가로지르며 춤추듯 걷지 않고서는 사방이 막힌 튜브에 갇친 환상이 조여오는 때였기에 ‘스테이홈 일부 해제’ 뉴스를 듣자마자 부리나케 연락을 취하여 몽유병 환자가 될 뻔한 동지들을 불러 모았다.
야외 활동이 허락되었다지만 동행하는 움직임에 목적이 있어야 이 불확실성 시대 만남을 갖는 반토막의 이유가 (단체산행이 아직 이르다는 조심성 깊은 지인들에겐 건강체 실존의 당위성이고 나를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산악인의 자존감?) 될 것이기에 내친 김에 ‘2020 마운트 레이니어 정상 등반대’를 꾸렸다.
산에 숲을 보자 몸에서 나오는 벅찬 감격의 찬사는 입방정이였고 콧구멍 안으로 들어오는 풀내음 머금은 눈에 젖은 촉촉한 산소는 바이러스 치료제였다. 햇볕 등쌀에 끈적거리는 된 땀을 흘리며 바람에 대한 감정이 야속했던 것은 오랫만에 느끼는 유별난 질투였다. 숲바람과 눈바람. 산바람과 강바람. 우리가 살고있는 자연에 언덕 너머 늘 있었던 바람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이참에 구성한 등반대 전원이 백컨트리 스키 등반대원이다. 기억에 저수지에는 스키를 신고 ‘캠프 뮤어 산장’까지 올라가 스키를 그곳에 보관하고 바로 마운틴레이니어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와 뮤어캠프에서 다시 스키를 타고 파라다이스 주차장까지 활강하자는 오래된 약속이 저장되어 있다. 약속했기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기억한다면 지켜져야 하는 침전물이다.
‘팬데믹’이 오기 전 지난 겨울 여러 성인 남여 들을 스키에 입문시켜다. 물론 겨울 주말에 하는 일이 알파인 스키강사여서 스노퀄미 스키장에 찾아오는 청소년과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내 학생의 대부분이였지만 지난 겨울에는 일부러 주중에도 시간을 할애하며 초로의 장년들에게 알파인스키와 백컨트리스키를 가르치고 전파하였다.
외줄에 서로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산 등반훈련이라 웃으며 단호하게 ‘군기’를 잡았지만 대원들은 몸을 날려 동료의 미끄러짐을 잡아주며 일부러 복창소리 드높이며 좋아라 오버들 한다. 그냥 모두 같이 신이난다. 이들이 산에 갈급하였는지 사람에게 갈급하였는지 조직에 갈급하였는지, 혹든 자유로운 움직임에 갈급하였는지 자세히는 모른다. 함께 하는 훈련을 통하여 알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들 각자 ‘존재의 무게’ 였다.
이미 상상과 공상과 모험을 위하여 스스로 조용할 곳과 조용할 시간을 찾는 나는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이후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사람끼리 오가는 것이 잠잠해진 덕분에 ‘하루키’를 읽었으며 그에 한 문장에 공감을 했다.
“우리가 부부관계를 정식으로 끝낸 뒤에도 친구로 지낸다는 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였다. 부부로 지낸 육년의 세월동안 우리는 아주 많은 것을 공유했다. 많은 시간과 많은 감정. 많은 말과 많은 침묵. 많은 고민과 많은 판단. 많은 약속과 많은 포기. 많은 연락과 많은 권태. 물론 서로 입 밖에 꺼내지 않고 속에만 품고 있던 비밀도 없지는 않았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숨기는 것이 있다는 감각까지도 제법 현명하게 공유해왔다. 거기에는 시간만이 배양할 수 있는 ‘자리의 무게’가 존재했다 .우리는 그런 중력에 요령있게 몸을 맞추고 미묘한 균형을 잡으며 살아왔다.” (기사단장 죽이기 중에서)
자연이 갖고 있는 미묘한 균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게 우리들의 일상이 깨졌다.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잠재된 욕심과 표출된 욕망이 이 미묘한 균형을 깨트린 것이다. 다시 되돌아 갈수는 없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 무게를 견디어 내야 한다.
글·사진 염승찬
산악문화 칼럼리스트
산행문의: ekoreabook@gmail.com
<저작권자 ⓒ 조이시애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owered by Newsbuilder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