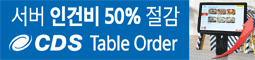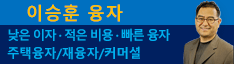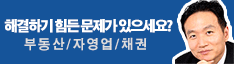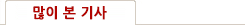산 이름이 템플(Temple)이다. 마운트 템플의 이스트 릿지는 '북미 50 클래식'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알파인 등반루트이다. 나는 이스트 릿지 등반을 계획하던 중 시애틀 우리산악회원들과 템플의 센테니얼 패스까지 하이킹 할 기회를 얻었다.
정상의 높이가 11,624피트(3544m)인 마운트 템플은 가이드북을 읽어보니 사방 450마일 안에서는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소개되어 있다. 유럽 알프스에는 산악열차 정거장 ‘샤모니’가 있다면 캐네디언 로키에는 온천 물 나오는 ‘밴프’가 있고 마운트 템플은 로키산맥의 대성전인 것이다.
이른 아침 오르막부터 소란이 있었다. 우리 팀보다 앞선 한 무리에 하이킹그룹이 트레일헤드를 출발하여 스위치백의 급경사를 돌아 오르는데 ‘앞에서 곰이야’하고 소리친다. 화들짝 놀라 머릿속 생각을 멈추고 둘러보니 대원 모두가 제자리 서서 소리지르는 팀의 리더를 쳐다본다. "앞쪽에서 검은 곰이 저쪽(우리쪽) 경사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곰은 보이질 않고 곰 같은 그 팀 리더가 곰마냥 부산하다, 얼마를 지나서 별 탈없이 상황종료.
물 빛깔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모레인 레이크(Moraine Lake)를 끼고 있는 마운트 템플은 주차장 옆 호수 가장자리만 맴도는 관광객들과 하이커들로 아침 일찍부터 모레인 레이크 들어가는 도로 입구에서 차량진입을 통제할 정도로 붐비는 곳이다.
연파랑 모레인 호수가 걸어 올라온 비탈아래로 아담하게 청록색으로 변신해 보일 때쯤 우리들은 전망 트인 곳을 찾아 가쁜 숨을 고르며 휴식을 취하고 간식을 먹는다. 시애틀 근교의 ‘메일박스’나 가파른 스위치 빽 트레일을 오르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스칼라상타’다. 유대땅 빌라도에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 받으러 예수가 걸어 올라갔다는 28계단. 지금은 로마에 있다. 손과 무릎 만으로 오르면 속죄 받는다는 성스러운 계단. 난 잊혀지기 위하여 온몸으로 산을 오른다.
넉넉하게 쉬고 출발하여 2000미터를 건너 오르니 고원평지다. 사방이 탁 트인 언덕은 자잔한 나무들이 숲을 이루며 수목 한계선을 경계로 들풀 초지에 작은 개울이 이리저리 돌아 흐른다. 쪼갠 통나무 다리를 건너며 올려다본 큰 산은 바실리카 돔 지붕 끄트머리에 하얀 눈을 덥고 파란 하늘과 상통 중이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일지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바실리카 옆 궁창은 달력그림에서 본 씨스타나 성당에 천장화보다 멋있다. 미켈란젤로의 하늘은 정지됐지만 내 하늘은 회전한다. 하늘에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차용하는 것이다. 겉이 암울한 갈색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은 사람에게 받은 사랑조차 기억할 줄 모르는 무지 때문이다.
‘바티칸’의 쿠폴라 돔 전망대서 보는 성 베드로 대성당 광장이 두 팔 벌리고 나를 맞아 들이는 천국의 열쇠 형상 이라면 궁형으로 양팔 쳐든 센테니얼 패스에서 내려다 보는 작은 호수와 고산초원은 아늑한 포란 형으로 천상에 봉황이 내려앉아 모레인 호숫물로 마른 목을 적시며 파란 알을 품을만한 명당이였다. 시월에 차가운 바람이 성근 머리칼 사이로 재갈거리며 초원으로 내려간다.
베드로 대성당 284개 열주 위에는 신앙을 위하여 순교한 성인들의 신상이 산피에트로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내려다 보고 있다. 믿음은 도그마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실행하는 것이다. 센테니얼 패스 공제선상에 점으로 보이는 하이커 들이 우리들의 진행을 내려다 보며 어서 오라 웃고 있다. 먼저 맞은 매의 시원함이 우리를 보며 반기는 성인상 같은 저들의 환희다.
비탈진 돌무더기 사이로 난 좁은 길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긴다. 햇살은 껴입은 겉옷을 벗게 만든다. 고갯마루가 가까워져 오는 것은 머리를 들지 않아도 바람이 먼저 알려준다. 넘어가야 할 곳에는 늘 바람이 분다. 세찬 바람은 마지막 고빗사위를 힘들게 하지만 내려가거나 올라서거나 지나치면 바람은 잦아든다. 바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벽이 그것을 가려주는 것이다. 나의 벽은 누구일까 나는 누구에 가림 막이 되었을까?
우리는 파란 선을 따라 2800여 미터의 센테니얼 패스까지만 오르고 정지했다. 점심을 먹으며 3544미터 템플픽 정상까지는 열정에 붉은 선으로 루트만 그려보고 내려왔다. 풍광이 찬란한 센테니얼 패스까지는 모레인 호수 주차장에서 여섯 시간정도면 왕복하이킹이 가능하다. 명년이 되어 궁창이 다시 파랗게 열릴 때 ‘템플기사단’을 조직하여 마운트 템플 정상까지 바르게 올라볼 생각이다. 심호흡하는 마음은 여전히 내일의 산행을 기다린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벤프와 캐네디언로키 곳곳은 만년설에 둘러싸인 고봉들과 그 빛을 형언할 수 없는 수많은 호수들로 채워져 있었다. 초로에 건각들은 삶의 무거운 짐 잠시 벗은 맨 등판으로 낙조를 받으며 푸른빛 호수 앞에 담담하게 섰다. 우리들의 황혼은 아직 멀었다.
글·사진 염승찬
산악문화 칼럼리스트
산행문의: ekoreabook@gmail.com
<저작권자 ⓒ 조이시애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owered by Newsbuilder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