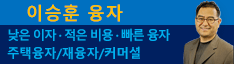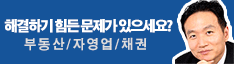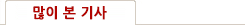내가 기억하는 라면은 국민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다.
엄마는 동네에서 어렵게 사는 아이들 대여섯 명을 이끌고 무조건 우리 집 건너방에 아이들 (내 또래도 있고 나보다 좀 더 커보이는 아이들도 있었다)이 우리 집에 함께 살면서 우린 매 끼니를 나누어 먹어야 했다. (막내딸인 난 내게 올 사랑이 저리로 간듯해서 무척 억울해 했었다)
아버지의 월급은 우리 가족 먹이기에 맞춘 듯 딱 맞았는데 (엄만 살면서 모자란다는 애기를 해 본 적이 없으시다. 그러고보니 우리 형제들 부족하다는 얘기를 전혀 안 한다) 엄마가 데려온 시장통에서 바닥에 기어다니며 카셋트 장사하는 칠석이 오빠는 다리 한 쪽이 없었다. (죽어도 오빠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오빠라 불러! 한마디 하시면 안 들을 수가 없었다)
전라남도 깡촌 시골에서 내려와 공장 다니다가 쫒겨났다는 그런데 시골에 다시 가도 자기 아버지에게 두드려 맞는다며 우리 집에서 오래도록 살던 꼭지 언니 (꼭지 언니는 나중에 우리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살면서 야간엔 학교 다니고 아침엔 우리를 돌봐주었다가 나중에 세탁소 보조 총각하고 선데이서울 함께 보곤 하다가 눈이 맞아 결혼을 했다)
그리고 이를 매일 안 닦는다고 엄마가 칫솔에다 소금을 잔뜩 묻혀서 기다리던 순구. 머리에 백선이 생겨 머리를 빡빡 깍고 있던 희구. 약간 다리를 절면서 눈 한 쪽이 사팔이었던 봉희 (봉희도 나보다 나이가 세 살이 많았는데 키가 적어서 난 한번도 언니라 부른 적이 없었다. 봉희하고 얘기를 하려면 이름은 안 부르고 본론부터 얘기를 했다. 엄마에게 언니라 안 부른다고 혼날까 봐 조심해가며.....)하고 두 명이 더 우리 집에 있다가 몇 달 후 공장 취직이 되어서 우리 집에서 나간 희자 언니 하고 용숙이 언니.
이들 때문에 우리 집은 복잡하고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형제 7명하고 할머니 아버지 엄마 모두가 굶은 적이 없었다. 이것이 우리 엄마의 사회사업 시작이었다.
어느 날 동회에서 연락이 왔다. 오까다 아줌니 (엄마가 일본서 살아서) 동회를 다녀가라고 ...엄마는 5학년인 나와 중학생이던 울 오빠를 데리고 동회를 갔다. 동회에서는 그때 당시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약간 빛 바랜 주황색 플라스틱 봉투에 담겨져 있는 삼양라면 10박스를 우리 엄마에게 주시며 집에 아이들 먹이라고 하였다.
이때는 라면이 새로 나와서 귀할 때라 난 생라면을 학교에 가지고가 간식으로 와작와작 씹어먹으며 아이들에게 잘난 체를 했었다. 나중에 엄마에게 들켜서 손바닥을 대나무 자로 맞으며 살살 빌었던 기억도 새롭다.
하여간 이때부터 라면을 지겨우리만치 먹어서 커서는 라면을 입에 안 대려고 라면 먹는 곳은 피해다녔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내 나이가 엄마 나이가 되는 시간이 되니 가끔씩 그때의 그 라면 맛이 너무나 그리워지곤 한다. 라면을 아무리 끓여 보아도 예전 맛이 안 난다.
아무튼 그때 복잡하던 우리 집이 그리워지면 가끔씩 그 라면 맛을 생각해보며 이제는 건강라면을 끓여본다.
먼저 두개의 냄비에 물을 끓인다.
한 개의 냄비에 라면을 넣고 데친 후 기름기를 뺀 후에 물이 끓고 있는 다른 냄비에 라면을 넣고 3분 정도 끓인 다음, 집에 있는 야채들을 넣고 스프를 넣은 후 또다시 4분 정도 끓인 후에 그릇에 내오기 전 계란을 탁 깨넣고 30초 정도 더 끓여낸 다음 예쁜 그릇에 담아 놓고 7080 씨디를 틀어놓고 라면을 먹는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터질 것 같은 이내 마음을 ..그대 위해서 라면 나는 라..면도 먹네...
우리 막내 오빠가 라면을 먹다가는 (하도 라면 많이 먹어서 지겹다고)기타를 잡으며 부르던 이장희씨의 나 그대에게 라는 노래였다.
울 오빠가 그 좋은 노래를 라면송으로 바꾸어 불렀었다.
지금은 천국에 있는 오빠의 라면송도 그립고 신선한 총각무로 만들었다는 총각김치 맛도 일품이고 (지인이 선물로 주셨다) 콩나물 시금치, 버섯이 듬뿍 들어간 라면이 넘 맛있다.
가끔씩 오빠도 그립고 그때 그 라면 맛이 그리울 때엔 라면을 끓이며 옛 추억에 젖어본다.
레지나 채
소셜워커, 워싱턴가정상담소 소장
(206) 351-3108
<저작권자 ⓒ 조이시애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owered by Newsbuilder
Powered by Newsbuil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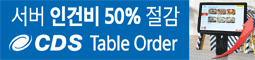















![[레지나의 레서피] 라면 맛있게 먹기](/paper/data/news/images/2015/06/1_L_143503763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