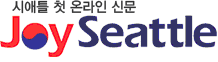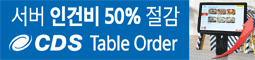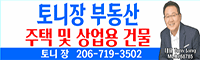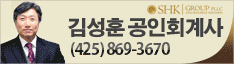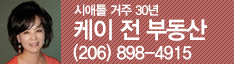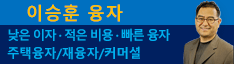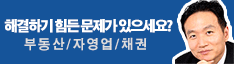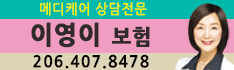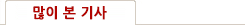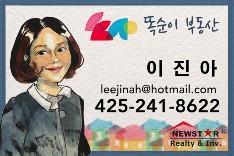"한인 학생들은 토론식 수업보다는 말 한마디 없이 뒷전에 앉아 있어도 간섭받지 않는 대형 강의를 선호한다. 비판적 사고 부족으로 강의를 듣거나, 토론을 하거나, 책을 읽을때 남의 의견에 쉽게 동요되어 자신의 아디어를 뒷전으로 움추린다." 지난해 6월 "대학생 저널"에 기재된 "미국 교수들의 눈에 비친 한인 대학생들" 논문의 요지다.
모든 생각의 시작이라고 할수있는 비판적 사고력이 부족한 것은 미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미국인들은 점점 무식해지고 무비판적이 되고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 기자를 지낸 수잔 제코비는 최근 저서 "비이성적 시대"에서 한탄했다. 한국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국은 주입식, 기억위주, 객관식 시험과 점수, 성적 중심의 교육을 조금 덜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데 학교가 가장 큰 장애물 역활을 하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다. 알렉산더 잉글리스는 “교육원리”에서 미국 학교의 목적을 이렇게 요약했다. “학생들의 반사적 복종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의 권위를 강조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 콘트롤하기 쉽게 하고, 순위 성적표를 만들어 자신의 위치와 역활에 못을 박고, 극소수 엘리트는 리더로 훈련시키고 나머지는 도전장을 내밀지 않고 지도자, 정부, 기업주에게 순종하는 착한 시민을 양산하기 위해서다.” 어느 나라든 비판정신이 높은 국민들이 많으면 골치거리인 것은 마찬가지다. 해서, 그 뿌리부터 꺽겠다고 “알려진 비밀”인 교육원리로 의무교육을 실행한다.
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에서 비판은 그리스어의 '분할하다, 쪼개다'는 뜻을 가진 krinein에서 유래한다. 그것은 어떤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 비난을 퍼붓고 흠을 잡는 부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제시된 자료를 조목조목 따져서 폭넓게 이해하려는 종합적 분석 사고방식이다.
예를 들자. 많은 학생과 부모들이 유에스 뉴스& 월드 리포트에서 발표하는 대학순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절대시 한다. 하지만, 그것은 학장들의 설문, 교수 자원, 입학 경쟁율, 표준시험점수, 졸업생 기부금등 input 위주로 작성되었다. 정작 중요한 대학원 진학율, 졸업생 사회활동, 재학생 만족도 같은 output은 빠져있다. 우월감과 자아도취에 가득차 아집, 편견, 권위주위에 빠진 사람을 대학이 만들어내도 그 순위로는 측정할 길이 없다.
또한, Princeton Review, Washington Monthly,에서도 제각기 측정기준을 달리하여 순위를 발표한다. Princeton Review는 교수 강의, 토론 참여, 강의실 시설을 기준으로 하면 재학생 만족도가 리드, 웰레슬리, 포모나, 위트만, 윌리암스, 피쳐 대학순으로 리버랄 아츠 대학들이 압도적으로 우세한것을 보여준다. Washington Monthly는 "사회적 유동 (social mobility) 기회”를 기준으로 하바드 27위, 예일 38위, 프린스톤 78위, 스탠포드 9위로 발표했다. 이렇틋, 여러가지 순위를 종합해 보면, 대학평가는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수있다.
분석력과 종합적 사고력이 빠진곳에 찾아드는 것은 혼동과 독단이다. 혼동에 빠지면 걸맞지도 않은 대학에 못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마음으로 원서를 내고, 독단에 빠지면 상위 순위에 올라온 대학은 무조건 좋다고 고집하며 이름을 못들어본 대학은 대학으로 취급도 안한다. 비판적 사고의 시작은 스스로 생각하며 모든것을 회의하고 질의하는 것이다. 권위, 전통, 고정관념, 관습, 무엇이든 무조건 받아들이기 이전에 먼저 의문을 가져야 한다. 16세기 이탈리아 물리학자 갈릴레이가 신성 불가침으로 여겨졌던 천동설을 비판하고 나서 지동설을 주장하며 당시의 우상을 파괴하는 용기를 보여준것 처럼 말이다.
(자료제공: c2education, c2education@gmail.com, 425-672-8900)


 Powered by Newsbuilder
Powered by Newsbuilder